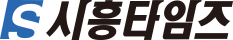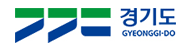[글: 이상범] 김민기의 노래를 듣는다. ‘뒷것’ 되기를 자처한 김민기의 발자취를 좇는다. 조명의 사각지대에서 희미해야 할 그의 자태가 눈부시게 선명하다. 덮으면 덮을수록 더욱 도드라지는 게 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게 있다. 진실이다. 김민기의 삶이 그렇다.
그의 앨범 재킷을 보라.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악귀를 쫓는 탈의 형상이다. 섬뜩하다. 그 ‘불만 서린 얼’ 앞에, 나 한 점 부끄러움 없노라, 당당할 사람 과연 몇이나 될는지. 그러나 김민기를 가까이하는 사람들은 안다. 그 탈의 이면을. 그 탈 속에 머금은 미소를, 눈웃음을, 정겨움을, 살가움을, 따뜻함을. 그 ‘어여쁜’ 얼굴 앞에 녹아내리지 않을 사람 없으리라. 근엄하게 구성지고, 단호하게 부드러우며, 냉혹하게 따뜻한 음성은 또 어떤가.
멀리서나마 그의 삶을 곁눈질하다 보면 존경심보다는 부채감이 앞선다.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산다는 생각은 나만의 것일까. 갖은 은혜를 다 열거하여 무엇하랴. 고마움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보다는 마음이 무겁다. 너무 외롭지는 않을까, 너무 고독하지는 않을까,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가슴이 시리다. 측은해 미치겠다. 형편없는 나의 삶에 부끄러워 죽겠다. 그 많은 빚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느끼는 빚이 있다. 아니, 그 많은 빚이 하나로 점철된 특별한 비목이 있다. 절대 갚을 길 없는 큰 빚. 김민기의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가 ‘지켜낸’ 노래.
창조자의 삶이 흐트러질 때, 그 작품이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되는지 우리는 안다. 어떻게 버려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잘 안다.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지만, 부끄러운 창조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들이 뒤따른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그 창조물의 생명력은 얼마나 다른가.
김민기의 노래는 숭고하다. 순결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강력하다. 그가 그렇게 지었고 또한 그렇게 지켜냈다. 노래를 짓는 일이야 순간이지만, 그 노래를 지켜내기는 일생을 거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김민기의 노래에 감동하고, 그의 노래로 손에 손 맞잡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노래를 떠받드는 그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아침 이슬”이 변함없이 영롱하고, “상록수”가 눈부시게 푸르를 수 있는 연유는 노래 뒤에 그의 헌신과 희생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그의 삶은 늘 위태로웠다. 김민기에게 돈과 명예, 권력은 이미 주어진 것 아니었을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 얼마나 많은 제의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을까. 당연한 것을 제의하는 것은 결코 유혹이 아니다. 순리다. 권리다. 그러니까, 그는 많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 온 것이다. 그 풍요를 어떤 가치로 물리쳤을까. 그 편리를 무슨 철학으로 외면했을까.
혹시 노래에 때가 타지는 않을까 저어했을까. 이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된 노래에 피해를 주진 않을까 우려했을까. 그는 노래를 지키는 삶을 택했다. 긴 밤 지새우며 자신을 가다듬었다. 섬뜩한 그의 눈빛이 응시하는 표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렇게 지켰기에 김민기의 노래는 나의 노래가 되었다. 우리의 노래가 되었다. 민족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김민기의 노래는 김민기다. 김민기는 노래다. 김민기가 노래다. 자신의 삶으로 ‘노래의 품질’을 보증한 김민기, 자신을 죽임으로 노래를 살린 김민기. 자신만의 노래를 포기하고 국민의 노래로 승화시킨 김민기. 노래가 고귀한 만큼 그의 삶이 고귀하다.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저장하는 이유다. 가장 위태로울 때 외쳐 부르는 이유다.
그 단단한 사람, 김민기가 아프다. 그 든든한 사람, 김민기가 휘청거린다. 크게 탈이 났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비참하다. 내가 흔든 걸 텐데, 우리가 키운 병일 텐데. 울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닌데. 이를 어쩐다. 정말 어쩐다.
그의 노래로 기도하련다.
김민기를 노래하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