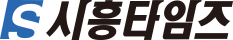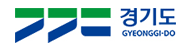[글: 김경민] 지난주 주중 한적한 저녁, 은계호수공원을 거닐다 버스킹 연주를 준비하는 한 청년을 보게 되었다. 연주에 어울리는 영상 스크린 준비까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온 것 같았다.
[글: 김경민] 지난주 주중 한적한 저녁, 은계호수공원을 거닐다 버스킹 연주를 준비하는 한 청년을 보게 되었다. 연주에 어울리는 영상 스크린 준비까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온 것 같았다. 그런데 공원담당자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 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공간사용을 위한 예약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연주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버스킹을 보기 위해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했는데 규칙이 그러해서 결국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청년버스커에게 카페 공간에서 준비한 버스킹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고, 해당 청년은 적극적으로 제안에 응했고 그곳에 앉아 버스킹을 기다렸던 시민들도 함께 카페 공간(아마츄어작업실)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급 번개 버스킹(?)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놀랐던 것은 식상할 만큼 보편화 되어버린 기타 치며 노래하는 버스킹이 아닌, 바이올린 버스킹 연주였다. 음악에 문외한인 필자이지만, 공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가 전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당시 현장에 클래식 전문가가 있었는데 바이올린 버스킹 연주에 찬사를 보냈다.
버스킹 연주가 끝나고 청년 버스커와 잠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청년은 인천에서 시흥시 은계호수공원에 처음 공연을 왔던 것이었다. 보통은 일산 호수공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시흥에 은계호수공원을 알게 되어 처음 준비해서 왔다고 한다.
필자가 청년에게 버스킹 예약하는 것을 몰랐냐고 물었더니, 해당 청년은 상당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그 청년의 논리는 이렇다. 버스킹이라는 것이 즉흥연주인 것인데, 한 달 전에 예약을 한다는 것이 즉흥연주라는 버스킹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자주 갔던 일산 호수공원에서도 도망 다니면서 연주를 했다고 한다. 즉흥연주인 버스킹과 기획공연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버스킹문화가 정착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약제를 폐지하게 되면 소음수준의 연주 같지 않은 연주로 시민들의 신고를 유발 시키는 사례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관련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몇 년 전 필자는 체코 프라하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추어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당시 거리를 거닐다 곳곳에서 연주하는 버스커들을 보고 너무 놀랐다. 우리나라에서 버스킹하면 보통 기타치며 노래하는 단순한 이미지가 연상된다. 그러나 프라하에서는 필자가 모르는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의 연주를 볼 수 있었고, 연주 하나 하나가 모두 위대한 작품 같았다.
그래서 필자는 여행계획을 급변경하여 길거리 버스킹 연주를 한 주 동안 보기로 했고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며 판매하는 CD를 모두 구매했다. 특이한 것은 당시 모든 연주자들이 길거리연주를 허가하는 라이센스를 목에 걸고 있었다. 그 라이센스가 없이는 길거리 연주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체코 프라하의 수준 높은 버스킹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프라하식 버스킹 정책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버스킹 라이센스 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에 맞게 실력 있는 청년 버스커를 모집한다. (시흥시 거주자로 한정하는 방식은 반대한다. 시흥시 내부이던 외부이던 가장 실력 있는 연주자가 시흥시 곳곳에서 연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둘째, 시흥시 버스킹 라이센스가 있는 버스커들은 장소 예약없이 공공장소이던 민간장소이던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해당 장소에 행사 등이 있는 특수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방식은 연주자 스스로가 기획자가 되어 다양한 공간에서 독특한 연출이 가능하게 되며 높은 수준의 버스킹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셋째, 장르의 다양성을 평가 기준에 적용해야 한다. 버스킹은 즉흥연주 그 자체인 것이지 기타 치며 노래하기, 유행하는 춤추기가 마치 버스킹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다. 마치 그 외 연주들은 버스킹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거 같다. 필자가 프라하 거리에서 본 수많은 버스킹연주는 대부분 악기연주였고, 그 악기 대부분을 필자는 알지 못했다. 아마 프라하에서 연주자를 지정할 때 악기의 다양성을 고려했던 것 같다.
필자의 제안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필자는 실력 있는 청년 음악인들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청년’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이 결코 청년문화를 발전시키거나, 문화예술 자체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청년이 하나의 특권처럼 작동하는 순간 무질서가 나타나게 된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명 문화예술의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문화예술의 형태가 지원을 위한 지원이 되는 순간 문화예술의 궁극적 목표인 ‘자유’ 라는 게 억압되기 시작한다. 제도는 늘 자유를 억압한다. 그렇다고 제도가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도는 최소화되야 하고, 세련되어야 한다.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는 말이 있다. 식상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떠나간다. 사람들은 언제나 새롭고, 자유롭고,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며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예술인은 언제나 시대를 뛰어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숨 쉬어야 한다. 그게 ‘생명’이다.